[시간들] 詩번역도 이긴 AI, 문과생은 뭘 해야 살아남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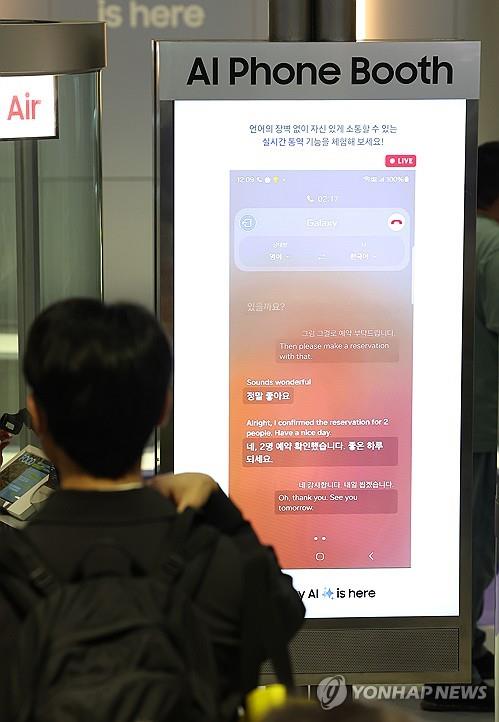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선임기자 = 인간과 인공지능(AI)이 조선시대 한시(漢詩)를 영어로 번역하는 대결을 벌였는데, AI가 압승을 거뒀다고 한다. 인조 때 우의정을 지낸 장유의 「홀로일 때 삼가라(愼獨箴·신독잠)」를 각자 영어로 옮긴 번역문을 두고 진행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영문학과 교수 16명 가운데 12명이 AI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인간의 번역본이 낫다고 평가한 교수는 2명뿐이었다.
12대 2라는 압도적 스코어 속에는 AI가 인간의 고유 영역을 넘보고 있는 현실이 담겨 있다. AI는 장유가 쓴 '하늘'을 단순한 자연 공간을 뜻하는 sky(스카이) 대신 초월적 존재를 떠올리게 하는 Heaven(헤븐)으로 옮겼다. 단어만 바꾼 게 아니라 한시 속에 담긴 뜻까지 짚어내려 한 것이다.
이 대목에서 기자의 호기심이 발동했다. 국내 명문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개탄하는 한글 기사를 AI에 넣고 10개 주요 외국어로 옮겨보라고 했더니 순식간에 결과물이 나왔다. 특히 포르투갈어 번역에서 무릎을 탁 치게 했다. '서울대'를 '브라질의 상파울루대(USP) 격인 서울대'로 옮긴 것이다. 서울대의 국내 위상을 브라질 독자가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친절하게 덧붙인 셈이다.
장유의 한시 번역 대결 소식과 찰나에 무더기로 쏟아지는 외신 번역 뉴스를 접하다 보니, 앞으로 인문학도들, 특히 글쓰기 종사자들은 어떻게 먹고살아야 하느냐는 두려움이 밀려온다. 하긴 이제는 명문대 공학도들의 자리조차 AI에 위협받고 있으니, 특정 전공만의 문제로 치부할 일도 아닌 듯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문학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또렷해지고 있다는 희망도 든다. AI가 아무리 깔끔한 문장을 만들어도, 그 말이 맞는지, 맥락에 어긋나지 않는지 가려내는 일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제 인문학의 역할은 많이 읽고 잘 표현하는 능력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힘으로 옮겨가고 있다. 학자는 더 깊이 맥락을 따지고, 기자는 책상에서 일어나 현장으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AI가 대량 생산하는 지식의 진위를 가리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감수 능력을 기본으로 탑재해야 할 것이다.
공부하지 않는 문과생은 AI가 저지를 수 있는 왜곡의 공범으로 전락하겠지만, 탄탄한 인문학적 소양과 안목을 갖춘 이에게 AI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수십, 수백 배로 확장해 줄 최적의 비서가 될 것이다. AI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불안에 떨기보다 인문학이 쓰일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자.
j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